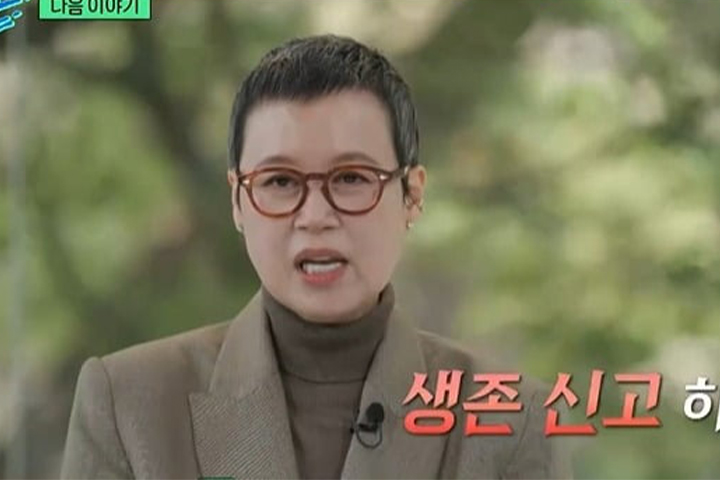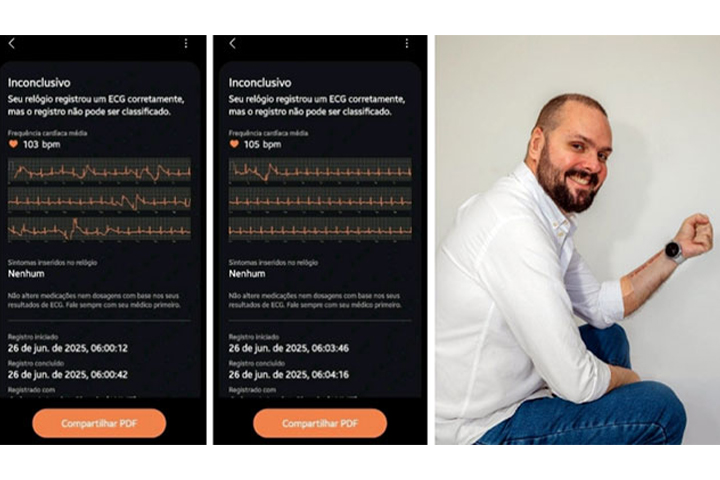이주민 차별 문제에 "어려워요"…거장이 눈물과 웃음으로 던지는 묵직한 질문
 14년 만에 한국 관객을 다시 찾는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은 단순한 재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일교포 2.5세 정의신 연출은 이 작품이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 재일한국인의 존재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19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의 한 곱창집을 배경으로 끈질기게 살아가는 용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조국이라 여기면서도 일본에서 나고 자라야 했던 이들의 복잡다단한 내면과 감춰진 역사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2008년 한일 양국 국립극장의 합작으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작품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다시 돌아온 것은,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14년 만에 한국 관객을 다시 찾는 연극 '야끼니꾸 드래곤'은 단순한 재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재일교포 2.5세 정의신 연출은 이 작품이 오늘날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 재일한국인의 존재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는 1970년대 일본 간사이 지방의 한 곱창집을 배경으로 끈질기게 살아가는 용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을 조국이라 여기면서도 일본에서 나고 자라야 했던 이들의 복잡다단한 내면과 감춰진 역사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2008년 한일 양국 국립극장의 합작으로 초연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작품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다시 돌아온 것은, 그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증명한다.'야끼니꾸 드래곤'의 서사는 허구의 인물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정의신 연출 자신의 삶과 시대적 경험이 깊숙이 녹아있다. 특히 주인공 '용길'의 대사 상당수는 정 연출의 아버지로부터 직접 비롯된 것들이다. "한국에 가려고 짐도 다 쌌는데, 동생이 감기에 걸려 배를 못 탔다"와 같은 대사는 실제 있었던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버지가 겪었던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회한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처럼 지극히 사적인 기억들을 작품 속에 투영함으로써, 연극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재일한국인 공동체의 보편적인 정서와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재일 디아스포라의 삶을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이 작품의 또 다른 백미는 공연 시작 20분 전부터 펼쳐지는 독특한 '프리쇼'에 있다. 배우와 악사들이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오가며 흥겨운 연주를 들려주고, 실제 고기 굽는 냄새를 공연장에 피워 올리며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이는 연극을 일종의 '제사'로 여기는 정 연출의 연출관이 반영된 결과다. 어린 시절, 제사를 위해 어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손님들과 나누던 기억처럼, 그 역시 잘 준비한 음악과 장면, 그리고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을 단순한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용길이네 곱창집에 모인 손님처럼 극의 일부가 되어 함께 웃고 떠들며 슬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든다.
궁극적으로 정의신 연출은 '야끼니꾸 드래곤'을 통해 이주민과 소수자가 겪는 차별의 문제를 조명하고,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광장을 열고자 한다. 그는 소수자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인생이란 희극과 비극이라는 두 개의 철로가 끊임없이 교차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작품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깊이 있게 통찰한다. '기생충'의 연극 각색 등 다양한 매체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그가 14년 만에 다시 꺼내든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외면해왔던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 newsnaru.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